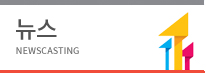원주의 음식문화는 2000년도에 들어와 변하게 됐습니다.
원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과 부도심으로 재편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주요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원주의 음식문화 지형은 새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자리를 지켜왔던 노포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음식점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맛을 이어오고 있는 노포, 전통 맛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원주의 신흥택지 개발지역에 주로 존재했던 노포들은 일부는 자리를 지키고, 또 일부는 자리를 옮겨가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노포들이 지역을 넘어 널리 알려지며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과 맛집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들 노포는 상호에 ‘원주’라는 지명을 넣어 원주지역의 맛집이나 노포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노포 중 원주하면 ‘추어탕’을 떠 오르게 하는 집이 바로 ‘원주복추어탕’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추어탕을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문헌 기록으로는 1123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 개경에 와서 한달간 머물렀던 서긍이 남긴 ‘고려도경’에 추어탕이 나옵니다.
미꾸라지는 개천이나 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이므로 서민들이 그 이전부터 즐겨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추어탕은 1천년 넘게 즐겨왔던 음식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여름철 더위와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에게 미꾸라지는 요긴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질과 비타민도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약학서인 ‘본초강목’에도 “양기에 좋고 백발을 흑발로 변하게 하며, 초롱의 등심에 익힌 것이 제일 맛있고, 양사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정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주식 추어탕은 남원, 서울, 경상도와 함께 전국 4대 추어탕으로 꼽힙니다.
특히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석달 동안은 자연산 추어탕을 맛볼 수 있기에 추어탕의 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 원주식 추어탕의 원조가 ‘원주복추어탕’입니다.
‘원주복추어탕’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원주지역에만 40여개의 추어탕집이 생겼습니다.
원주시도 이 추어탕을 지역의 대표 음식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주복추어탕’의 창업주는 이복순 할머니입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원주가 고향이 아닌 포항 출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포항에는 해병대 부대가 있는데, 남편이 해병대에 있을 때 만나 결혼을 하면서 원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추어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이 있어서 추어탕을 만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해서 처음 원주에 왔는데, 무언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기 잡는 것을 좋아했고, 미꾸라지를 함께 잡으러 다니면서 추어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추어탕을 종종 대접하기도 했는데, 술안주로 고추장을 풀고 파를 넣어 얼큰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이때 추어탕을 맛 본 지인들이 “맛이 좋다”며 음식점 창업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옛날 원주고등학교 앞에서 작은 음식점을 열게 된 겁니다.
상호에 들어가는 ‘복’도 할머니 이름에서 따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손님들에게 복을 드리겠다는 의미도 더했습니다.
주로 오는 손님들은 원주의 공무원과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넘어 외지에도 맛이 알려지면서 현재 식당 손님의 70% 정도는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고추장 양념으로 맛을 내는 원주식 추어탕의 특성상 고추장이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고추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수를 뺀 소금과 메주를 많이 사용하는 추어탕용 고추장을 매년 담가 눈대중으로 봐도 200개 가까운 장독에 저장해 놓고 사용합니다.
매년 꾸준히 담그다 보니 10년 이상 묵은 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할머니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탕 맛은 장맛이고, 오래 묵힌 장으로 그냥 장국만 끓여먹어도 보약”이라는 말에 장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50년 넘도록 쉬어보지 못한 할머니는 현재 막내 딸 김장심 사장과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사장도 어머니의 장과 밑반찬에 애정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학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