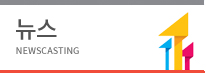어촌마을들의 속담 중에 ‘도시에서 어정거리다 보면 굶어죽지만 바닷가에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라는 말을 빗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주는 식량은 해산물, 즉 계절마다 다양하게 잡히는 생선, 조개 및 해조류 등이 있으며 이를 주로 이용하는 어촌의 식생활은 농경지역이나 산간 지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동해안 어촌에서는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보다 훨씬 즐기는 식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생선은 싱싱한 것은 회로 먹었고, 그 외에도 찜이나 구이, 탕, 국 등의 반찬으로 다양하게 이용했습니다.
특히 명태는 껍질부터 아가미 내장까지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알뜰하게 먹거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보양식으로도 이용했습니다.
북어에 피문어, 홍합, 파를 함께 넣어 국을 끓여 노인이나 환자의 보양식으로 애용했는데, 이를 ‘건곰’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흐릿해지면 명태의 간유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밭작물은 필요할 때마다 밭에서 따오면 되지만 해산물은 잡을 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산물은 쉽게 상하기 마련이어서 냉장과 냉동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해풍에 건조하거나 소금에 절여 먹는 방법을 선택해 저장성을 높였습니다.
바다에서 적절히 불어오는 해풍은 생선의 건조와 더불어 짭짤한 바다내음까지 덤으로 보태주었기에 내륙지역에서 건조한 것과는 격이 다른 품질의 건어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선을 말리는 시설을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장은 항구에 많이 설치됐으나 가정집 마당이나 옥상, 식당 앞, 구멍가게 앞 등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널어 말려 양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자미와 고등어, 오징어, 곰치 등 각종 생선을 말렸으며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해조류는 햇빛 좋은 날 모래밭에 널어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짝 건조한 생선은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간장과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조림을 하거나 또는 무, 시래기를 넣고 지짐이로 해서 먹습니다. 이때 된장이나 막장을 풀고 시래기 등의 채소를 넣으면 양이 늘어나서 모든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찢어서 술안주나 간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건조하는 것 외에도 소금을 이용하는 염장 문화도 이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젓과 꽁치젓, 명란젓, 창난젓 등의 젓갈류로 만들거나, 동해안 특유의 발효식품인 식해도 담가 먹었습니다. 식해는 소금이 부족한 동해안에서만 보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발효식품입니다. 곡물을 발효시키면 발생하는 유산이 저장성을 증가시켜 모자란 소금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생선의 저장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젖산으로 인한 특유의 새콤한 맛이 일품인 식해는 가자미 식해를 비롯해 오징어 식해와 명태 식해, 멸피 식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김치류도 농촌이나 산촌 지역과는 달리 해산물을 넣고 담그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해산물김치’는 김치에 명태와 오징어 등 그때그때 잡아 온 해산물을 넣고 꽁치젓과 잡어젓 등 여러 젓갈을 넣어 담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생태를 양념에 버무려 김칫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김치는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명태 대신 대구를 넣기도 하지만 김치에는 명태가 제격입니다.
명태나 대구의 머리 부분도 김치에 사용하는데 특히, 명태 아가미인 서거리를 넣고 만든 서거리깍두기와 창난을 넣어 담근 창난채김치는 동해안의 대표 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멸치젓이나 새우젓을 주로 넣지만, 동해안에서는 꽁치젓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꽁치나 멸치를 많이 잡았을 때는 젓갈을 담습니다.
팔고 남은 것은 생선 째로 큰 솥에 넣고 끓인 후, 생선은 건져내고 남은 맑은 젓국에 고춧가루는 생색으로 넣고 생강과 마늘을 넣고 각종 푸성귀로 김치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어른 손바닥 만한 조선무를 4등분 하여 무청이 달린 채로 넣기도 했는데 나중에 김치로 익었을 때 무청이 있는 그대로 한 입 베어 물던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시마와 미역 외에도 지누아리와 고르매 등 동해안만의 해조류가 있으며, 이를 무침과 튀각 등으로 다양하게 먹어 왔습니다.
특히 쇠미역으로 만든 튀각은 고성의 잿노리상, 강릉의 모내기상 등 지역의 특별한 행사에 빠지지 않는 반찬으로 이용됐습니다.
강릉에서는 해조류의 일종인 도박을 보릿가루나 밀가루를 묻혀 밥위에 쪄서 일명 ‘도박 버무리’를 해서 먹는데, 이를 먹으면 포만감도 있었으며 식감도 쫀득쫀득하게 찰진 것이 마치 미역귀를 먹는 질감과 비슷해서 즐겨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조류의 일종인 진저리는 푹 삶아 연한 부분만 취해서 막장에 묻혀서 먹기도 했습니다. 또 미역 철이면 미역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볶아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미역국을 비롯해 미역을 된장이나 막장을 넣고 찌개를 끓일 때 넣어 짭짤하게 먹는 ‘미역장’이나 미역쌈 등을 먹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도 강릉에서는 장례식장에 미역으로 된장국을 끓인 것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학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