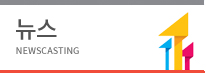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는 어부 외에도 잠수 어업을 하는 해녀와 머구리가 있습니다.
어부는 배에서 낚시나 그물을 사용하지만, 이들은 맨몸으로 바닷물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합니다.
해녀와 머구리를 조업의 형태로 구분해본다면 해녀들은 특별한 장구 없이 바다로 잠수해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머구리는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기에 좀 더 깊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해녀들은 거의 여자들이고 머구리들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동해안은 수온이 차갑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자맥질로는 해산물을 쉽게 채취할 수가 없어 동해안의 머구리들은 거의 남자들입니다.
강원도에서 잠수어업을 하는 해녀와 머구리들은 동해안 중에서도 대진항에 가장 많으며, 대왕문어를 비롯해 해삼과 멍게 등의 연체류와 미역과 김 등의 해조류를 채취합니다.
강원도 잠수어업인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700여 명 정도로, 그 중 고성에 가장 많으며(328명), 다음으로 강릉(119명), 삼척(109명)의 순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의 해녀들은 강원도가 고향인 해녀와 제주도에서 일 때문에 왔다가 이곳에 정착한 제주 출신 해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주해온 해녀의 대부분은 동해안의 미역을 따기 위해 고용됐다가 작업이 끝난 후에 지역의 남성들과 결혼하여 정착한 경우이며, 이들을 ‘출가해녀’라 하는데 현재 동해안에 남아 있는 해녀들의 근본이 됩니다.
동해안의 해녀는 300여 명으로, 만여 명 정도인 우리나라 해녀의 3% 정도에 해당하며, 이웃하는 경북 동해안 해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강원도 해녀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전체 해녀 수의 약 40% 이상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해녀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업이 고단하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수입이 많지 않아 신규로 해녀가 되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바다 자원의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 해녀들은 바다에서 미역과 성게, 문어, 돌김 등을 수확합니다. 물질은 보통 오전 6시에서 6시 30분, 늦어도 오전 8시부터 시작돼 낮 1시에 마무리됩니다.
미역작업을 하는 음력 1~4월 동안에는 오전 5시부터 물질을 시작합니다.
해녀들은 한 시간에 약 삼십여 번의 잠수를 하며, 보통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셀 수도 없이 많이 잠수를 해야 하는 노동 강도가 심한 직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날씨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다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히 해녀를 ‘저승의 돈을 벌어 이승에서 쓰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그만큼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 해녀들은 물질만 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 물질하고 와서는 오후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가계를 위해 애쓰는 강인하고 끈질긴 생활력을 갖고 있는 것이 강원도 해녀의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동해안 해녀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 자립적이면서 동료애가 강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거칠고 위험한 바다에서 살아남고 보다 나은 수확을 위해 해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잠수와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며 삶을 함께하는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 어로의 문화에 대한 특성은 생활문화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큽니다.
해녀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하루 4~5 시간을 보냅니다. 고된 노동을 마친 해녀들이 먹는 식사는 고된 일을 마친 노동자들에게 달콤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강도에 비해 먹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해녀들의 먹거리로 예전에는 감자를 보리밥에 넣어 먹었고 된장국과 김치에 청어의 배를 따고 내장을 빼 낸 후 소금에 절여 삭힌 청어와, 소금에 절인 정어리를 밥 위에 올려놓고 쪄서 먹는 것 등이 주요 부식이었다고 합니다.
동해 깊은 바다 밑의 저도 어장에서 잡은 자연산 홍합과 전복으로 홍합찜과 전복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한 내장을 넣고 끓인 전복죽은 해녀들의 건강 보양식입니다.
갓 잡은 문어로 만든 숙회는 제주도가 고향인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양에서는 물질하러 나가는 사이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어 두는데, 섭을 볶아두고 가면 그 아들은 볶은 채소와 들기름을 넣고 섭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향긋하고 고소한 맛이 어머니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또 우뭇가사리를 채취해 말려서 저장하였다가 우무묵을 만들어 놓고 크게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채로 썰어서 콩가루를 듬뿍 뿌린 후 양념간장과 섞어 먹기도 합니다.
(자료 도움: 강원학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