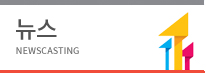동해안의 특색 있는 대표 먹거리로 곰치와 망치, 삼숙이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오십보 백보로 못생기고 이름 또한 촌스럽지만, 맛으로 따진다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겨울철 최고의 별미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과거 어획량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찬밥 신세였다는 이들 못난이 삼총사는 최근 없어서 못 파는 어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화된 거리나 맛집이 생겨날 정도로 우수한 자원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곰치는 영동 지역에서는 곰처럼 미련스럽고 퉁퉁하게 생겼다고 하여 ‘물곰’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는 물메기입니다.
또 ‘물텀벙이’라고도 하는데 잡아 올린 어부들이 다시 물에 ‘텀벙’ 던져 버렸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물에 다시 던져 버리는 이유는 값도 없었고 덩치가 커서 그물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별 볼일이 없어서 버리는 생선이지만, 김치와 갖은 양념을 넣어 해장국을 끓이기도 하였으며, 처마 밑에 매달아 말려두었다가 찢어 먹으면 쫄깃한 맛이 좋아 어린아이들 간식으로 애용되기도 했으며 물론 술안주로도 그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주가들은 곰치가 어떤 생선인지는 몰라도 해장국으로 나온 곰치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망치는 동해안 특산 어종으로 못생김을 논할 때 빼 놓으면 섭섭한 생선 중에 하나로 표준어는 ‘고무꺽정이’입니다.
피부의 끈적끈적한 액 때문에 ‘코풀레기’라고도 합니다.
머리에는 점액 구멍이 있고 몸 전체에 점액이 많으며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생김새가 아귀와 비슷하다고 하여 황아귀라고도 합니다.
겨울에 많이 잡히고 뜨끈하고 얼큰한 매운탕에 대한 수요도 겨울에 집중되는 탓에 보통 겨울을 제철로 여깁니다.
망치는 매운탕으로 즐겨 먹습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 않지만, 뼈가 굵고 머리가 커서 아주 진한 육수가 우러나는데, 살이 단단한 덕에 끓여도 쉬이 풀어지지 않고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망치 매운탕은 육수에 집 된장을 풀고 끓으면 손질된 망치에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어 끓입니다.
이렇게 끓인 매운탕은 국물의 향과 풍미가 그윽하며, 먹기 전에 삶아진 간을 으깨 풀어 넣으면 감칠맛이 감도는 매운탕이 됩니다.
삼숙이는 ‘삼수기’라고도 불리며 전라도에서는 멍텅구리라는 의미에서 ‘삼식이’로 불리는데, 표준명은 삼숙이입니다.
생긴 것은 두꺼비처럼 우둘투둘하며 돌기들로 빽빽이 덮여 있고 배도 불룩한 것이 정말로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맛이 좋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 생선입니다.
강릉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으로 대체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생활하며 초겨울이 제철입니다.
비린내가 적으면서 구수하고 담백하며 쫄깃한 맛과 오돌오돌 씹히는 연골을 먹는 재미 때문에 강릉에서 별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살이 연하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 속 풀이 해장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리던 생선이었으나 삼숙이탕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값이 비싼 생선이 됐습니다.
삼숙이는 주로 매운탕으로 요리하는데, 고추장을 푼 물에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끓여내면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손질법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뺀 뒤에 껍질을 벗기면 됩니다.
더 맛있게 먹으려면 명태 곤이를 넣어 끓이면 국물이 더욱 시원해집니다.
삼숙이 조림도 별미입니다.
삼숙이를 손질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토막을 내고 냄비에 무를 깔고 삼숙이를 얹은 후 양념장을 넣고 약간의 물을 부어 졸입니다. 거의 익으면 갖은 양념을 넣어 한소끔 더 끓이면 쫄깃쫄깃한 삼숙이 조림이 완성됩니다.
짭조름하고 쫄깃한 삼숙이 조림은 밑반찬으로 제격입니다.
(자료 도움: 강원학연구센터)